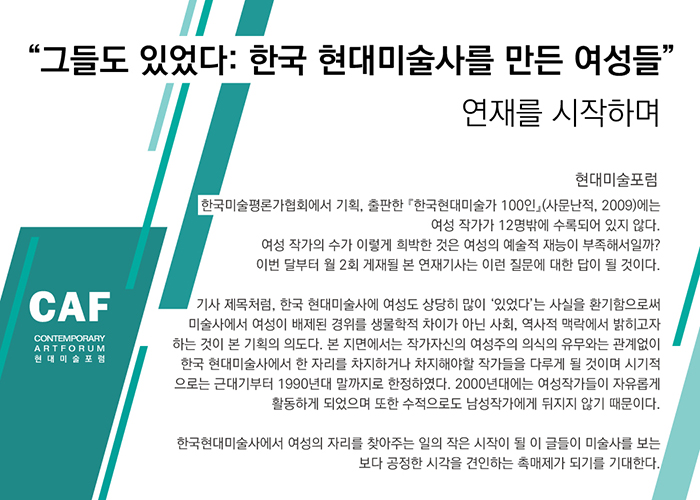정정엽: 여성들이 초대되는 화면
정정엽(1961~)은 양식적으로 어떤 경향이라고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 없는 작가이다. 그림을 기본으로 하지만 오브제를 이용한 설치도 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퍼포먼스도 한다. 그는 최초의 활동을 이른바 노동현장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985년에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그는, 대학 재학 중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인사동에 전시 카탈로그를 수집하러 다니기 시작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던 미술에 대한 어떤 질문들과 더불어 노동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지금까지의 작품 여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그의 초반기 작업과 활동들은 민중미술계열 소그룹에 참여하는 활동의 역사로도 기술 가능하다. 그가 만들거나 참여했던 그룹은 ‘터’, ‘두렁’, ‘미술패 갯꽃’, ‘여성미술연구회’ 등이며, 노동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가 그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중심 주제였다고 볼 수 있다. 모더니즘의 절정기에 미술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군부독재의 시절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다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행보를 시작한 정정엽은, 노동의 현장에서 당시 민중미술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판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판화는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리하여 시장에서 가치를 획득하는 대다수의 미술작품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매체였으며, 또한 단순한 흑백만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조형성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붓을 잡는 것보다는 노동자들의 손에 쉽게 들려줄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다. <면장갑>(1987), <봄날에>(1988), <이불을 꿰매며>(1989) 등이 이 시기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후 그는 다시 붓을 손에 잡았다. 1987년 이후 시대는 바뀌는 듯 바뀌지 않는 듯 요동을 쳤고, 그가 고민하던 노동의 현장과 여성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는 자로서의 인생을 선택했던 것 같다. 물론 이후에도 위안부의 문제와 탈핵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기들이 있을 때 거침없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시대가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문제들 뒤안길에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여성의 문제, 아니 그 자신의 문제가 그의 붓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1991년의 유화 작업 <집사람>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력단절여성(흔히들 ‘경단녀’라고 줄여 말하는)을 소재로 한 작업이다. 포대기에 아이를 들쳐 업고 빵을 든 한 아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구인란을 쳐다보는 한 여성이 이 그림의 주인공이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세월 좋게 시간을 보내는 전업주부의 존재들을 일컬어 ‘맘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오늘에도 복색과 구인공고의 내용만 달리 하면 현재도 별로 다르지 않은, 1991년 여성의 모습이다. 철없는 아이들을 둘이나 매달고, 아이들을 맡기는 비용까지 벌 수 있는 직업은 지금도 많지 않다.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이 된다. 그림 속의 여성은 직업을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엽의 문제의식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1995년에, 대학을 졸업한지 10년만에 열었던 첫 개인전의 제목은 《생명을 아우르는 살림》전이었다. 이 전시에는 각종 나물들과 나물 행상을 하는 여성들, 식사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가는 여성들, 밥상을 차리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어떤 여성은 캐고, 어떤 여성은 팔고, 어떤 여성은 사고, 어떤 여성은 그것으로 밥상을 차리는 이 순환 속에 여성의 삶에 대한 긍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첫 개인전에 등장하는 작품들 속 여성들은 1991년 《여성과 현실》전에 출품되었던 <집사람>이 너무도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보무도 당당하게 저녁거리를 담은 검정 봉지를 들고 걸어가며, 나물 꾸러미들을 놓고 함박웃음을 짓는 행상 여성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는 여성의 삶을 구속하고 커리어와 직업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들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대한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드는 그 ‘살림’이라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따스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당장 집어치우고 능력껏 사회에 나가 교환가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고,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살림’이 사실은 인간을 살리는 가장 근본의 행위라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결코 계몽적이고 교훈적이지 않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첫 전시회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대목은, 정정엽의 가장 잘 알려진 양식이 된 곡식이 처음 소재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색색의 곡식들이 자루에 담겨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알갱이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그려진 이 작품들이 이후에 하게 될 작품들을 예언이라도 하듯 섞여 있다. 이 팥과 콩들은 저희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흩어지기도 하고, 골목 끝에서 산사태처럼 무섭게 돌진하고, 너른 대지를 가득 채우고 하늘에서 쏟아지던 이 곡식 알갱이들은 급기야 2016년에 촛불광장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도 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았을 그 이미지, 한겨울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메웠던 그 장면을 조감으로 찍은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즐겨 그려오던 곡식들이 떠올랐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 알갱이 한 알갱이가 사실은 생명 그 자체인 것들인 곡식들이 한 꾸러미가 되어 반짝 반짝 빛나는 모습과, 추위에 손을 호호 불며 작은 촛불을 밝혀 뜻을 모았던 그 시절의 한 장면은, 다 살겠다고 나선 삶의 장면들이기 때문이었다. 팥알들로 그려진 그의 <광장 10>(2016~2017)은 민중미술을 한 축으로 해 왔던 그의 초년기 작품들과 여성의 삶으로부터 출발해 거의 추상적 미감에 이른 곡식 작품들에 이르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모두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곡식들은 싹을 틔운다.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먹지 않고 그냥 두면 싹이 난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맹독이 있어 싹을 먹으면 인간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큰 일이 날 수도 있다. 인간이 맛있게 먹는 그것들이 독자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그들의 경고로도 알 수 있다. 정정엽은 먹을거리에서 싹이 난 이러한 장면들을 초현실주의적 병치 기법으로 그려냈다. 여기저기에 싹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된 감자들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인간이 만든 네모난 공간을 휘젓고 돌아다닌다. 정형화된 괴물보다 더 무섭게 기이한 형태로 자라서 계단을 내려오고 방문을 나선다. 인간은 이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하지만 이들은 생명을 가지고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대비, 인간과 자연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서로 맞닥뜨리는 이러한 대비의 광경은 분명 인간이 간과하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메시지이다. 자연 플러스 인간보다 자연 마이너스 인간이 더 지구에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태계는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자구책을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른 시기부터 인물을 그려왔다. 앞서 최초의 개인전에서도 보았고, 2009년의 개인전에서도 지인들의 얼굴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푸른색을 배경으로 하여 붉은색으로 그려진 인물들은 자화상을 포함하여 미술계에서 잘 알려진 얼굴들도 보인다. 구체적인 인물들의 초상화이지만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해 가지는 감정을 실어 일종의 몽타주기법으로 그린 것이다. 자신의 초상화 머리에는 유기체적인 덩어리들을 뚫고 철근이 우글우글 구부러져 있고, 박영숙 작가의 얼굴 옆에는 꽃송이와 작은 카메라 렌즈, 트라이포드, 각종 행성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사실 정정엽과 박영숙 작가의 개성을 아는 이들은 비죽이 웃음이 나올만한 초상화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인물을 그려 왔지만, 콩과 팥, 나물, 각종 생물들의 매력에 밀려나 있다가 다시 한 번 거대하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9년 《최초의 만찬》전에서였다. <최초의 만찬>은 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형식을 염두에 둔 작품이다. 그리고 이 <최초의 만찬>은 참석 내빈들을 바꾸어가며, 또한 그 크기를 달리 하며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대한 만찬이다. 2019년의 <최초의 만찬>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창 밖 풍경을 송전탐이 우후죽순 솟아있는 우리나라 풍경으로 대체하고, 모두 남성이었던 예수와 열 두 제자를 여성들의 초상으로 바꾼 것이다.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최후의 만찬>이 너무도 역사적인 작품이기에, 그리고 신과 신의 제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대목에서, 많은 여성 작가들은 이 구도를 역전시키고 싶어 한다.
주디 시카고(Judy Chicago)의 <디너 파티>(1974~1979)와 메리 베스 에델슨(Mary Beth Edelson)의 <살아있는 미국 여성 미술가들>(1972)도 다 빈치의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들이다. 이밖에도 여성주의 경향의 미술가들이 다 빈치를 패러디한 경우들이 있지만, 정정엽의 작품이 이들과 다른 이유는 만찬 자리에 초대된 인물들이 매우 일관성 없이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가운데 자리한 서지현 검사와 이토 시오리, 한복을 입은 나혜석, 게릴라 걸즈의 한 사람, 동상으로 만들어진 위안부 소녀상 정도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인물들은 작가의 지인이거나 우연히 여행에서 만난 식당 아주머니 등도 있어 유명과 익명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비장하게 비극으로 걸어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면 반갑게 만나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각자 먹는 음식도 그들이 빠져나온 문맥도 다르다. 이처럼 즐겁고 흥겨운 정정엽의 <최초의 만찬>은 여성 독립운동가 버전으로도 한 번 더 제작되었고, 어쩌면 향후 여러 버전으로 더 다양한 여성들을 화면에 초대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이윤희(1970~),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현재 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
ㅡㅡㅡㅡㅡ

정정엽, <집사람>, 1991, 캔버스에 아크릴, 116x91cm

정정엽, <moon>, 2008, 캔버스에 아크릴, 210x180cm

정정엽, <최초의 만찬 2>, 2019, 캔버스에 아크릴, 50x10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