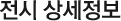상세정보
2009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갤러리인데코에서 강승애의 열 네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강승애, 짙고 감미로운 향기서성록 |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벨기에 출신의 정물화가 얀 페이트(Jan Fyt)의 그림중에 <죽은 새와 사냥개>가 있다. 죽은 새가 축 늘어져있고 그 곁을 사냥개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동물화이다. 단순한 동물화같지만 사실 이 그림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시나무 덩굴은 ‘지상의 고뇌’를, 개는 ‘파수꾼’을, 피흘리는 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17세기 정물화에서는 상징적 의미의 알레고리가 적극 사용되었는데 가령 땅에 떨어진 이파리나 시든 과일은 ‘인생의 유한성’과 ‘지상의 덧없음’을, 백합은 ‘순결한 정신’을, 튤립은 ‘고귀함’과 ‘사치’, 해바라기는 ‘신실함’과 ‘헌신’을 각각 의미하였다.

역사의 창고안에 들어갈 뻔했던 알레고리(은유적으로 의미를 전하는 표현형식)를 강승애의 작품에서 재발견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승애의 작품에선 알레고리가 화의(畵意)를 전달하는 중추적인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지시하는 의미를 풀어내는 것이 그의 작품해석에 관건이 된다.
강승애는 오래 전부터 식물을 모티브로 삼아왔다. 식물의 이파리, 줄기, 씨앗, 새 싹, 나무, 열매, 꽃 등이 그가 즐겨 사용하는 모티브들이다. 종래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뚜렷한 윤곽을 지니고 있어 식별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 이미지들이 점차 흐려지는 추세에 있다. 이미지들을 위한 바탕에서 점진적으로 바탕과 이미지의 구분이 흐릿해지고 이미지 자체도 매스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이 쉽사리 추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은유의 형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씨앗은 ‘믿음의 원소’, 빗줄기는 ‘영적인 축복’, 꽃은 ‘신앙의 결실’, 컵에 담겨진 물은 ‘성령의 충만’을 각각 표상한다. 작은 씨앗에서 새 싹이 나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는 과정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성숙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사람이 식물과 다른 것은 내적인 성숙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도량은 성숙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식물이 ‘성장’으로 완성되어간다면, 사람은 ‘성숙’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의 예술은 이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점화(點火)된다. “작은 것의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위대한 사람의 눈에는 위대해진다.”(퀘스텐마허) 작고 소박한 것은 믿을 수 없을만큼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한편 형식의 층위에서 보면, ‘겹침’은 그의 작품의 중요한 조형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감과 물감을 중첩시켜 투명 및반투명의 표면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먼저 밑칠을 하고 그 위에 덧바른 물감이 중첩되어 얇은 막(幕)을 형성하는데 마치 셀로판지를 살짝 덮었을 때처럼 아래에 깔린 물감이 은근하게 스며나온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탕위에 빠른 붓질로 깔깔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마치 빗질을 한 것처럼 사이사이에 일정한 틈이 생겨 비가 오거나 햇살이 내리쬐는 것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의 작품의 또다른 특징은 물감을 살짝 번지게 하여 운치를 살리는 운염법이다. 특이하게도 작가는 물감의 수용성을 강조한다. 물감을 주위로 퍼지게 하거나 서로 잘 어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물감과 물감을 뒤섞이게 하고, 그리하여 연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이끌어낸다. 톤 위주의 분위기, 유동적인 흐름, 물감의 투명성 따위는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들이다.

이번 열 네번째 개인전에서 작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효과이다. 그의 작품을 보면 한결같이 섬광이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강렬한 빛은 아니다. 대체로 은은한 빛이며 고요한 빛이어서 있는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광원으로서의 빛을 그렸다기보다는 빛을 받은 사물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신비스러운 빛이 아니라 잔잔히 일상에 머물고 있는 포근하고 따듯한 존재로 다가온다.
앞에서 필자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은유체계로 볼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빛’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물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곳곳까지 스며들어 마음속에 향기를 퍼트리고 미소를 짓게 한다. 천상에서 불어오는 향기에 취하고 연인의 품에 몸을 맡긴 여인처럼 신앙의 달콤함에 취한 작가의 행복한 나날을 짐작하게 해준다. 작가는 하나님의 실재를 만끽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기쁨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알려준다. 그의 작품에는 하나님을 만끽하는 즐거움이 실려있어 그 향기가 짙고 감미롭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