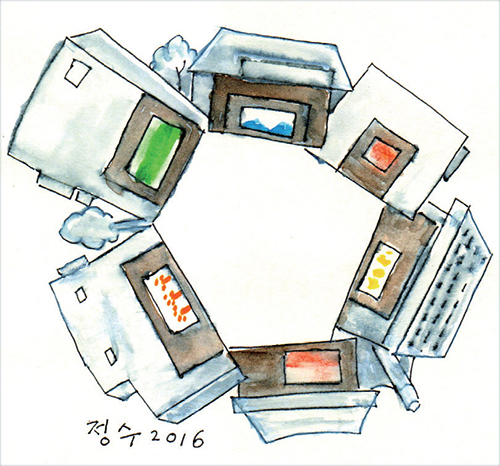요즘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화랑들을 찾을 수 있다. 주위에서 전시한다며 주는 팸플릿을 받아 보기도 하고 오픈 때 참석해서 축하해 주기도 한다. 인사동이나 삼청동 등 화랑가에서 그림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1970-8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서울엔 화랑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안국동, 수송동, 경복궁 맞은편 프랑스문화원까지 합해서도 열 개가 채 되지 않았다.
지금은 몇백 개가 된다고 하니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경제 발전과 함께 많이 늘어난 셈이다. 미술관, 대여화랑, 상업화랑, 대안공간 등 양적으로 풍부해졌다. 지방에도 많은 미술관과 화랑들이 생겨났다. 물론, 상업 화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일반인들이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기회가 많아졌다. 좋은 일임엔 틀림없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중요한 화랑들이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개성 있는 독특한 화랑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몇몇 화랑들이 한국화만 꾸준하게 전시 및 판매를 하거나 사진만 취급한다든지 도자기만 다루거나 서예, 문인화만 대관을 해주거나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나름 개성을 쌓아가는 화랑도 있지만 드물게 보는 경우들이다.
대관 화랑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서구 화랑들의 경우도 작가를 발굴해서 전시를 개최하고 지속해서 그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한 소장 작품을 판매도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화랑에서 취급하는 작가나 작품의 성격이 판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화랑에서는 극사실계통의 그림을 취급하고 다른 화랑에서는 현대인들의 얼굴을 표현한 작품만 전시하며 또 다른 화랑에서는 앵포르멜(Informel) 계통의 작업들만 다루고 저쪽 화랑에서는 나이브(naive)한 풍경 작업들만 내보인다. 그 외에도 이쪽 화랑에선 아주 고전적인 평면 작업만 고집하고 반대편 화랑에서는 오브제 작업이나 설치 작업만 전시하는 식으로 전문화되고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화랑이 꽤 많다는 것이다. 화랑들이 다양한 그림을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전시하고 거래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여 판매만 하는 상업 화랑도 각각 화랑의 개성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니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업에 맞는 화랑에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고 컬렉터 입장에선 자기가 원하는 성향의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화랑에 가서 구입을 하면 된다.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이해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다. 시류나 유행에 덜 민감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의 경우 거의 모든 화랑이 백화점식 화랑이다. 온갖 종류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거래도 하고 취급한다. 이 화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이 다른 많은 화랑에서도 구입이 손쉽게 된다면 화랑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된다. 저쪽 화랑에 없는 작품들이 이쪽 화랑에서 전시가 되고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시장기능이 확장되며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림 거래나 전시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단계라 생각된다. 수요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특성화된 고유의 화랑 이미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 작가들이나 작가 지망생들이 전시하고 싶을 때 ‘아, 내 작품은 그 화랑에 어울려. 그곳에서 전시해야 되겠어’ 라는 확신이 드는 화랑이 많아진다면 또한 컬렉터 입장에서도 ‘어떤 시대, 누구의 작품은 그 화랑이 전문이지, 그 화랑으로 가봐야겠네’ 이런 인식이 차츰 든다면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는 확장되는 미술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다.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신기루 같은 것이고 좋은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을 테니까
김정수(1955- ) 홍익대 미대 및 파리 헤이터판화공방 수학. 1983년 도불. 발메갤러리 전속작가 역임. 발메갤러리(파리), CJ Gallery(미국), Kikuta화랑(일본), 선화랑, 갤러리작(한국) 외 개인전 30여 회, 단체전 100여 회. 2004년 진달래 소재 그림을 한국에서 발표 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