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영
공공장소에 세워진 동상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와 충돌하며 의미를 생성한다. 2024년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여러 공방은 이를 증명하는 한 사례이다. 동상의 철거를 둘러싸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 간의 법적 분쟁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일 뿐, 본질적인 것은 특정 역사적 인물을 공공의 기억 속에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일 것이다. 공공장소에 권위주의 시대 통치자의 동상을 세우는 행위는 고루해 보인다. 동상의 얼굴이 대구시장의 얼굴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를 둘러싼 갈등의 또 다른 화젯거리였다. 이렇게 진부할 수 있는 논쟁이 오늘날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동상이라는 조형물이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도구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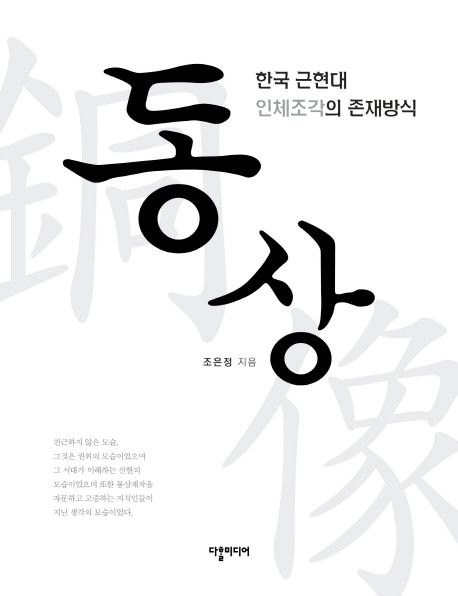
출간된 지 올해로 9년이 된 조은정의 『동상: 한국 근현대 인체조각의 존재방식』(다할미디어, 2016)은 이 소란에 대해 중요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동상은 숭배나 비판의 대상 이전에, 특정 시대의 권력이 자신의 이념을 가시화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로 드러난다. 한국 사회의 동상은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근대적 도구로 이식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이순신과 같은 ‘애국선열’을 소환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동상 건립은 지배자의 자기 정당화와 대중 교화를 위한 전략적 행위였다. 이 책은 동상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인물에 대한 호오(好惡)의 문제를 넘어, 공공성과 기억의 정치학이 충돌하는 지점임을 일깨운다. 저자는 한국 근현대 동상의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동상 건립과 철거가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는 또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진부한 정치 행위와 이에 대한 저항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비판하는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행위는 고루하지만, 그 고루함이 현재의 가치와 충돌하며 벌어지는 다툼은 지금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동상의 등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이식된 동상 문화를 다룬다. 2장 '근대 동상'은 식민지 시기 동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전쟁 속에서 동상이 존재한 방식을 살피며, 동상이 인물과 동일시되며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상을 조명한다. 3장 '현대 동상'은 해방 이후 건립된 동상들을 다룬다. 4장 '환경과 동상'에서는 동상의 기능이 다변화되는 현시대의 양상을 포착한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연예인 동상이나 드라마 주인공 동상은 과거의 권위적, 교훈적 기능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와 소비의 대상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동상이 기념비에서 환경조각이자 공공미술로 개념이 확장되는 과정으로 분석한다.
정다영 d1a3ye@gmail.com
 0
0
 0
0
FAMILY SITE
copyright © 2012 KIM 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이 페이지는 서울아트가이드에서 제공됩니다. This page provided by Seoul Art Guide.
다음 브라우져 에서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This page optimized for these browsers. over IE 8, Chrome, FireFox,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