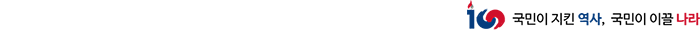화가 가운데 한국미술사에서는 물론 제주미술사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제주의 이름이 있다.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 1885-1956)이라는 눈부신 이름이다. 이런 이가 어디 제주뿐이겠는가 마는 오늘 이렇게 김석익이란 이름을 말할 수 있으니 제주 미술사는 그나마 행운인 셈이다.
김석익은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고향 산천을 지키며 고단한 생애를 견뎌 나간 처사(處士)였다. 또 그는 한국 근대미술사상 몇 안 되는 지사화가(志士畫家)의 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청운의 뜻을 품고 육지로 나가 의병장 기우만(奇宇萬, 1846-1916) 학맥을 잇는 길을 선택했지만 참혹한 국망의 현실 앞에 기우만의 ‘구국 격문’을 품고 귀향하여 산림처사의 삶을 시작했다. 산림의 처사들이 그러하듯 김석익은 서당을 개설하여 인재 양성에 혼신을 기울여 나갔다. 그가 펼친 심재문하(心齋門下)에서 항일 독립투사를 배출했고 광복 이후 문하생들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여러 분야로 진출해 식민지 이후 제주를 재건해 나갔다.

김석익, 석국도, 1923, 133.4×33.8, 종이, 최열 소장
또한 김석익은 『탐라기년(耽羅紀年)』을 비롯한 숱한 저술에 생애를 바침으로써 20세기 제주문화사에 굵은 자취를 남겨놓은 탁월한 문인으로 우뚝 섰다. 게다가 그는 제주의 역사를 그냥 그렇게 정리하는데 그친 이가 아니었다. 그는 제주 4.3항쟁에 대하여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면서 “무한한 참극, 유사 이래 없었던 참화”라고 함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기준으로 하는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였던 인물이다.
저 김석익이란 이름은 문장가이자 서예가일 뿐 아니라 화가로서 빛나는 이름이었다. 먼저 그는 『근역시화(槿域詩話)』와 『근역화단명가초(槿域畫壇名家抄)』라는 저술을 남겼는데 이는 자신이 예인이자 미술인이라는 자부심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김석익에게 서예가란 칭호는 이미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으나 화가란 칭호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를 잘 아는 이들조차도 사용한 적이 없다. 다만 2004년 후손의 기증으로 제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김석익전’에 <묵죽도>와 <매화도>가 나옴으로써 김석익이란 이름이 화가였음을 드러냈다. 게다가 그는 지사화가의 존재를 연구하는 미술사학의 손길에 의해 지사화가의 한 명으로 분류되었다. 참혹한 식민지를 경험한 제주에서도 역사와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지사화가가 이렇게 있었음을 당당하게 보여준 것이다.
맑고 단아한 그의 화풍은 이미 2015년 필자가 「제국과 식민지 사족 지사화가」에서 심재체(心齋體)라는 개성 어린 독자풍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 뛰어남을 예증하는 또 다른 작품이 있다. 계해년(癸亥年) 그러니까 ‘1923’년이라는 제작연도가 밝혀진 <석국도(石菊圖)>를 보면 그 단아정제(端雅整齊)한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태호석(太湖石)을 두드러지게 부각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변함없는 천년의 뜻이 그러함을 상징한 것일 거다. 이토록 멋진 석국도를 남겼으므로 언젠가 제주미술사 아니 한국미술사를 저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제강점기 지사화가 항목에 김석익이란 이름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한 자리를 내어 줄 일이다.